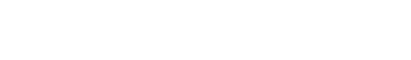차창으로 비쳐드는 노을빛이 참 아름답다. 지는 해를 마주하고 가는 방향이라 잠시 눈이 부시는가 했더니 찬란한 일몰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그대로 강물로 잦아든다. 가까이에 있는 유황온천을 찾아드는 길이다.
겨울 오후라서 들판은 텅 비어 있다. 내 집에서 온천으로 가는 길은 마을을 벗어나면서 산모롱이를 왼편으로 거느리고 개울과 어깨를 겨루며 간다. 원래 하루 세 번만 버스가 다니는 한가한 길이지만 오늘은 먼 곳까지 사람 그림자조차 아니 보인다. 먹이를 찾느라 자맥질 중인 새 몇 마리의 모습이 유일한 움직임이다. 오늘따라 바람도 없다. 찾아든 호텔 사우나도 마찬가지로 한가하다.
늦은 시간이라 서둘러 몸을 담그려는데 불안하게 욕조에 걸터앉은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등은 바라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굽어 있고 짧은 바닥에 닿으려 안간힘을 쓰는 다리는 제멋대로 흔들거린다. 겨울 갈잎처럼 여위어서 바닥에 내려서면 금방이라도 둥둥 떠오를 것처럼 보였다.
주름진 입술은 하얗게 바래어있고 눈은 아무런 내색도 담지 않았다. 놀란 동행이 탕 속으로 뛰어들어 노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을 주무른다. 시간이 조금 지난 물속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부르는 낮은 노래가 수면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하여 조심조심 부르던 노랫소리가 잦아든 후에 사우나 안에서 잠시 나눈 얘기로,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사람이 적은 시간에 아주 가끔 모시고 온다는 젊은이는 ‘아주 가끔’이라는 말에 힘을 주지만 그 말소리에 넉넉한 사랑이 묻어난다.
다시 몸을 담근 탕 안에서 갈잎 같은 노인과 아름다운 젊은이가 벗은 몸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 한쪽이 끌어가는 모양이지만 많이 놀아 본 솜씨다. 노인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일렁인다. 앞에서 춤을 추듯 양손을 흔들어대는 며느리는 아직 오십이 안 되어 보인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내게도 시어머님과 함께 목욕탕에 다녀온 기억이 있다. 아이도 생기기 전인 신혼 초로 어려웠던 터라 거역할 수도 없어 주춤거리며 따라나섰는데 마치 내 엄마가 씻기듯 구석구석 닦아주고는 당신은 굳이 등만 밀어달라고 하셨다. 담을 헐어내시려는 시도였을까. 그 후로 함께 공중목욕탕에 간 기억은 거의 없다. 노후에 고관절을 다쳐 자리에 누우셨을 때 몇 번 씻어드리면서 실은 얼마나 퉁퉁거렸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고 싶다.
부질없이 지난 일에 빠져들다가 슬쩍 거울 속을 넘겨다보니 구부정하고 눈빛이 흐린,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할머니가 눈을 마주하고 있다. 민망스러워 얼결에 고개를 돌리니 거울 속 할머니도 함께 고개를 돌린다.
아침이면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곤 하는데 오늘은 늦은 시간에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핵가족으로 변한 사회에서 아이나 어른 없이 모두 노인 봉양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해거름에 만난 정겨운 풍경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안도감으로 나를 끌어안는다. 내가 양평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집으로 가는 차 속에서도 마치 아기를 안은 것처럼, 선잠에 든 노인을 조심스레 껴안고 있다. 문득 하루를 돌아 저문 강에 잦아든 노을과 일평생 굽이굽이 골짜기를 지나온 노인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스친다. 며느리에 기대어 잠든 할머니의 모습에서 일을 끝낸 후의 평화를 본다. 나도 차츰 노을을 닮아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