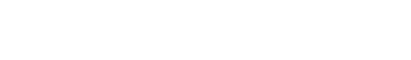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박 넝쿨 올리고
삼밭에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 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놋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우 나는 산골 애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짖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하겠소
여학생 시절 즐겨 애송하던 노천명의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 라는 시다. 센티한 소녀의 감성으로 매료된 시였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소박한 정서를 일깨우는 시. 구절구절 그리움이 배어 향수를 불러오는 시. 이 시에 나를 들여 그 여인으로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어릴 적부터 유교적 사상이 깊은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사대부의 기강을 내세우는 근엄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와서인지 내겐 고루한 사고방식이 배어 있다.
나는 가끔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상상을 펼치곤 했다. 그럴 때면 몇백 년 전으로 뒷걸음쳐 되돌아갔다. 조선 시대,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서였다.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주어진 소임에만 충실하며 올곧게 살았던 그 시대 여인들의 소박한 생활을 되받고 싶었다. 평범하고 단순한 농경시대 촌락 아낙네의 질박한 일상에서 안온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흙발머리 곱게 빗질하여 앞 가리마 반듯하게 타고, 은비녀 꽂은 쪽을 찌고 무명에 물들인 남치마 흰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여인은 나의 자화상이었다. 빛바랜 하얀 광목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두르고서 생기 있게 바지런떨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한 가정의 주부, 종종 걸음으로 집 안팎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림살이와 길쌈 낳기에 여념이 없는 아낙이 되고 싶었다. 외부의 잡다한 침범이 없는 숙련된 단순 노동으로 오직 가족만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온전한 가정의 주인댁 여인. 시간의 흐름에 보채지 않고 일과 휴식을 병행하며 하루의 매 시간을 다독이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었다.
아직 어둠이 깔리지 않은 초저녁, 이른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뒷설거지를 끝내고는 부엌을 나서며 앞치마에 젖은 손을 문지른다. 금방 스러질듯 실낱같이 떠 있는 가녀린 초승달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초사흘 손톱 달은 잰 며느리가 돼지밥 주고 오다가 보는 달이란다.” 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잠시 수수한 여유로움을 가슴에 담고 평화로운 얼굴이 된다. 소박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요한 저녁. 사랑과 그리움이 오롯히 솟아나는 시간에 내안의 영혼이 몸과 마음을 끌어안는다.
내가 사는 지구 속 작은 한 마을. 자연의 여음이 깃들고 소요가 없는 그곳에서 매어 있지 않은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꾸밈새 없는 소탈한 생활인으로 머물고 싶다.
어느 조그만 산골 여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