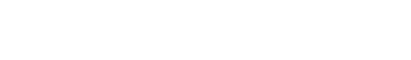어머니, 한 달이 넘도록 저녁마다 칼국수를 밀었습니다. 단식으로 저항하던 동생은 밀밭이 있으면 불을 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만 꾸면 밀가루를 뒤집어쓴 귀신들이 상모를 돌렸습니다. 가족들 모두 밀가루에 질려버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뛰지 말고 일찍 자라는 어머니의 공허한 구호 속엔, 전기세 걱정 말고 공부 더 하다 자라는 말을 목젖으로 밀어 넣는 모성애의 눈물이 짙었습니다.
윗사람에게 바른 소리 잘 하는 아버지의 구업口業 때문이었습니다. 불혹의 아버지, 면벽참선 하며 반성문을 썼지만 당신의 구도求道는 연중행사처럼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배가 고플 때 인간의 뇌는 오직 먹을 것에만 집착할 뿐, 다른 기능은 모두 정지되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00에서 거꾸로 세어가기를 반복하며 겨우 가수면假睡眠에 들면, 메밀묵 장수의 배고픈 소리가 백야白夜를 만들고는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와 무호흡 증세가 안방 미닫이문에 반복되어 부딪다 떨어졌고 노동에 지친 어머니의 신음에 문풍지가 제 설움을 짜내며 밤새 울었습니다.
동생과 둘이 고양이 걸음으로 부엌으로 가 점자 더듬듯 동치미 대접을 찾아 무 몇 쪽과 살얼음 얼어버린 국물을 이가 시리도록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포만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이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몰래 먹은 동치미 국물의 소금기가 자주 잠을 깨워 머리맡에 떠놓은 자리끼를 다 비웠습니다.
오줌보가 풍선처럼 터질 것 같아 몸을 비비 꼬며 일어났습니다. 오줌을 비우고 나니 배가 홀쭉해져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오줌 눈 것을 후회하고 들어오는데 통금해제 사이렌이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배부른 자에겐 소음이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겐 시계였고 어머니에겐 알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주 덮개를 열고 물질하는 해녀처럼 뒤주 속으로 상반신을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 겨우 소라 하나 건지고 숨이 차서 떠오르는 해녀처럼 뒤주에서 나왔습니다. 한 양재기도 안 되는 쌀이 어머니의 손을 초라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장남에게 생활고를 들킨 것 같아 손에 든 쌀을 감추며 아버지, 오늘 쌀 들여올 거라며 확신 없는 말을 허공으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고향 부산의 집까지 팔아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는 친구들의 셋집을 얻어주는 등, 남에게는 통이 컸던 아버지가 그분들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외상술을 사주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를 반복해서 주억거리다 수저도 들지 않고 구두 꺾어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설픈 연기로 배고픔을 속이는 아버지에게 시래기국이라도 드시고 가라며 국대접을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둠 속으로 당신의 무능을 숨겨버렸습니다. 살갑지는 않았지만 처자식을 배불리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종이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한쪽 어깨를 기울게 하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 뒷축에서 눈을 떼며 가부장의 철갑을 쓴 채 여필종부를 호령하던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강변 북로가 되어버린 한강 둑을 따라 일 킬로쯤 걸어 마포 전차 종점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빈 위장에 얼음을 품은 강바람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추위에 얼어 애벌레처럼 등이 굽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눈에 어젯밤 지우지 못한 노을이 시렸습니다.
겨울방학이라 우리 형제들 누에고치 형상을 한 채 동면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린 제비 새끼 같은 우리 다섯 남매에게 밥을 차려준 후, 평화시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나절에 나가신 어머니, 해가 노루 꼬리만큼 남았을 때 돌아왔습니다. 차비 아끼려고 먼 길 걸어갔다 오신 어머니 손엔 털실이 들려있었고 털실엔 실값을 깎기 위해 흘렸을 비굴한 웃음이 묻어있었습니다.
어머니, 몇 날 몇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때 쯤 아버지의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담임 선생님 뵈러 갈 때나 바르시던, 동동구리무에 구찌베니를 바르시고 아버지의 여자가 되어 아버지가 돌아오실 한강 둑으로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제 눈에 비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대로 무덤 속으로 따라 들어가실 분 같았습니다.
남들은 추억 때문에 칼국수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돈 내고 칼국수 먹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 글을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시절은 지워버리고 싶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몇 밤 더 자면 아흔한 살이 되는 어머니에게, 이승은 천상병처럼 소풍이었을까요? 복종을 위한 복종은 자유보다도 낫다는 만해 한용운의 시일까요?
양재일 시인
시인정신 발행인
양재일 : 19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시 전문 계간지 [시인정신]을 발행하고 있으며 양평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소설집 <대합실에서 만난 사람들>(1979년)과 시집 <타인처럼 부르는 노래> 외 다섯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