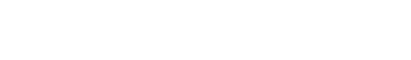10월입니다. 풀잎이 가을을 만나면 빛깔을 바꾸고, 나무가 가을을 만나면 이파리를 벗습니다. 그래서 가을날의 풍경은 아름다운가 하면 문득 쓸쓸해지기까지 합니다. 가을의 발길은 빠르기만 합니다. 찰나로 와서는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홀연히 떠나갈 채비를 합니다. 저는 지금 추수를 마친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텅 빈 너른 들판을 보고 있자니 막 기도를 마치고 나온 성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숙하고 정갈합니다. 사람도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오롯이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는 대지의 내심(內心). 그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것은 가을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성장하면 제 갈 길을 찾아 갑니다. 짝을 만나 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요람이던 부모의 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을은 더 분주하고 쓸쓸하나 봅니다. 어느덧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도 지나고 머잖아 겨울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인 절기와 마주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장중한 행사를 차분히 치러 내며 떠나갈 때를 준비합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이 계절에 부모의 슬하를 벗어납니다.
결혼 시즌입니다. 하여 주말이면 예식장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차장은 초만원이고 한참을 기다려야 간신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한 풍경이지만 그래도 참 좋습니다. 결혼식이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잔치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시월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무심히 올려다 본 달력에서 오늘이 결혼기념일임을 알았습니다. 해마다 추수철과 맞물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올해는 용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꼽아 보니 올해로 꼭 서른 돌을 맞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의 길동무로 꼬박 삼십년을 살아왔습니다. 긴긴 세월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럭저럭 무사하게 흐른 세월이라서 살며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있었던 삼십년 전의 그 날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스산하게 술렁입니다. 그것은 쉬 꺼내어 밝히지 못한 사연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이날에 전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두어 시간 전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꽃처럼 어여삐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홀로 해변을 서성이다니, 참으로 망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자꾸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망망대해 수평선 너머로 아물아물 햇살이 하얗게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신부는 무슨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고민에 빠져 결혼 당일 이처럼 혼자 바닷가를 배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느 신부가 결혼식 날에 홀연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당치 않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부의 행동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슨 마음으로 바닷가를 서성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이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는 불안, 아마 그런 심리적 기류에 휘말렸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것이 막상 현실로 들이닥치자 더럭 겁을 집어먹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새장과 같아 밖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안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애쓴다”는 구절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결혼이란 새장속의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그 새장 속으로 들어가려다 막상 용기가 안나 더럭 겁을 먹었겠지요. 그래서 그 가녀린 새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지 싶습니다. 게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설움마저 북받쳐 사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신부는 망연자실 가슴 떨려하며 혼자서 끙끙 애달아했을 겁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성냥불을 그어대고 불길이 번지자 놀라 후미진 곳으로 몸을 숨겼을 때처럼, 이 신부도 어딘가로 꼭꼭 숨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줄 압니다. 다행히 신부는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해변을 배회하며, 바다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분을 떨쳐 낼 수 있었습니다. 무심히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가 마음을 씻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황급히 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늦게 식장에 나타난 탓에 미용사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신부 스스로 서둘러 화장을 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강릉 변두리에 있는 조촐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친정 쪽에선 7시간이나 걸쳐 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길일을 택한 날이라 그런지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들어 찬 식장은 미어터질 것 같이 넘쳐났습니다. 북새통 속에서 입장을 하던 신부는 누군가의 발길에 드레스 자락을 밟혀 하마터면 낭패를 겪을 뻔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땐 참 경황이 없었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를 어떻게 치러냈는지 또렷한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다시 맞이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새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릿한 과거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혼자만의 사연입니다. 낯 뜨거워 오랫동안 감추었던 기억입니다. 강릉 바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새장 속에 들어가길 불안해했던 신부가 해변의 서성거림을 통해 번민을 지그시 눌렀다고, 두려움을 넘어 어렵사리 소망을 품었다고, 그리고선 백년가약의 푸른 동맹을 맺었다고,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새로운 지평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날의 그 특별했던 추억을 슬그머니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신부는 남몰래 혹독한 수련을 치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이후의 삶을 애써 가꾸고 열심히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자 하는 각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쑥스러운 기억이란 차라리 빛나는 추억이라 생각할까 합니다. 언젠가 한번쯤 그날의 강릉 해변을 찾아갈 일입니다. 파도에게 물어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