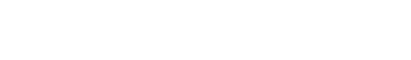서울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어 학생들이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교 기숙사에는 학생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 큰불이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생 60여명 규모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고 황급히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완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비상구 통로도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서 현관문 외에는 대피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관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열 수가 없었다. 당황한 학생들은 건물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경비원은 큰 화재가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유압기로 쇠사슬을 끊어준 뒤에야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날 화재는 한 학생이 공용주방에서 달걀을 삶으려고 전기 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깜박 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가 불에 타는 등의 직접적인 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방치했다가는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닷새 뒤인 20일 새벽 경찰관·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위해 다시 기숙사를 찾았다가 현관이 여전히 자물쇠로 잠긴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 설명을 100%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모(46) 씨는 “그날 제천 참사처럼 대형화재가 났으면 학생들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문을 잠가뒀던 것을 봤을 때 경비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