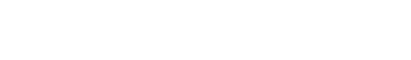산길을 걸으며
김금아
넓은 평원에는 능선 따라 봉긋봉긋한 무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 아주 오래된 듯한 봉분이 세월에 씻겨 나직하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시골 산자락쯤에 있는 초가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연상케도 한다. 이곳에 묻힌 망자는 서민이었던가? 돌비석도 간혹 눈에 띄나 거의가 나무 팻말이 심겨져 있다. 아예 팻말도 없는 곳도 많다. 나무 팻말엔 망자의 사망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으나 삭아버려 거의 지워지고 없다. 흡사 낡은 문패와도 같이 느껴진다.
무덤 곁엔 할미꽃이 피어있다. 피보다 진한 진홍빛 속살을 감추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다. 할미꽃은 뽀얀 솜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아기 손목같이 여리고 보드라워 꽃 이름과 어울리지 않은데도 또한 무덤가에서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이 퍽이나 어울린다. 듣기로는 할미꽃도 야생화라고 사람들이 파간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훤한 볕을 받고 꽃을 피운걸 보니 아마도 인적이 뜸한 곳인가 보다.
이곳은 전망이 장관이다. 맞은편에는 천마산도 보이고 또 한쪽엔 대신공원도 보이며 멀리 승학산 꼭대기도 눈에 잡힌다. 뿐만 아니라 멀리 영도섬도 바로 가까이 있는 듯 보인다. 감천 앞바다는 물론, 송도에 있는 높은 빌딩도 보이고 이것저것 종일 돌아다녀도 반도 못 볼 것을 여기선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이곳 망자도 심심하진 않겠다. 이 많은 곳을 다 관람하려면. 또한 이승에 있을 때 갑갑한 일 혹 말 못할 사연들을 저 넓게 확 터인 앞 바다에 토해놓고 심심찮게 넋두리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던가. 지금도 저 아래에는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벚꽃, 진달래, 개나리꽃, 간간히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검푸른 소나무도 박혀 있다. 누군가가 잘 가꾼 아름다운 정원 같다. 삶과 죽음을 이 꽃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듯하다.
숲에 가려 보이진 않지만 짐작으로 우리 집 높다란 아파트 옥상과 이곳에 공중 케이블카를 놓는다면 오 분도 안 걸릴 거리지 싶다. 어떤 나라에선 도시 중앙에 죽은 자 들을 모아두는 아파트를 지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들려 휴식도 취하고 죽은 자 앞에 꽃도 놓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은 묘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분수대에 물이 솟고, 잘 가꾸어진 정원수며 아이들도 와서 놀게끔 한 놀이 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잘 정리된 아파트 단지 같았다.
여기도 케이블카를 설치해 두고 주말이면 이 넓은 대지에서 부산을 관망도 하고 주말을 망자를 생각하며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도 되지 않을 까도 싶다. 또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머지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계기도 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어떤 이는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하여 가끔씩 화장터에 가 본다고 했다. 그것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방법이 되겠다 싶다, 허나 이런 주택가와 인접한 공동묘지에서의 느낌은 또 다를 것이다. 아무리 물질만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한줌 흙이 되기 위해 그런 무모한 욕심은 부리지 않을 것이다.
길게 늘어선 공동묘지 사이로 꼬불꼬불 한 길이 나있다. 묘들이 어찌나 촘촘히 있는지 그 곁을 조심스레 지나면서도 사람의 발등을 밟은 듯한 미안함이 든다. 어떤 무덤은 부부인지 나란히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들은 이야기로 합장한 묘를 파보면 관과 관 사이로 통로가 있는데 그곳이 흡사 사람이 밟고 다닌 것 같이 다져져 있다고 한다. 아마 이승의 연을 그곳에서도 오며가며 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어서도 서로 오가며 부부애를 나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닐는지. 무덤이 오기종기 모여 있으니 덜 외로워 보인다.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에 마른 억새풀 부대끼는 소리다. 갑자기 등뒤가 서늘한 느낌이다. 망자들도 이 꼬불꼬불 한 길로 나들이를 다니다가 방금 나하고 부딪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약간은 기분이 섬뜩한 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다.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만큼 마음 편안한 곳이 없더라고 했다. 수많은 무덤과 함께 누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편안하다고 했다. 오늘 와보니 그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한편은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서 즐겨 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긴 산 자가 무엇이라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옷감의 ‘겉과 안’ 차이라고 했듯, 누구나 눈감고 여기 누우면 또한 그 한쪽이 되어 있을 일 아닌가. 나 또한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이곳 망자들과 마주하고 잠들지 않는가. 무엇이 두렵다고 이리도 신경이 곤두서는지 모를 일이다.
바람기조차 없다. 태양 빛마저 조용히 내려와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게 한 것 같다. 마치 이곳이 망자들의 공간임을 암시라도 하듯, 걸음을 걸어도 무엇이 엉겨 붙는 것 같이 마음처럼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질식할 것 같은 고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걷는다.
공동묘지를 벗어나 오르막길을 오른다. 길가에 돌탑이 있다. 아마 이곳이 산 정상인 모양이다. 누군가가 이곳을 지나면서 피라미드모양으로 자잘한 돌탑을 쌓아놓았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리라. 그러나 돌탑도 높이 쌓이다보면 결국엔 제 무게에 눌려 바닥으로 내려앉고 말 것이다. 그럴지언정 나도 돌을 주워 그 위에 하나 더 올려놓는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등산 온 남자가 나를 보고 몹시 놀라며 여자 혼자 이런 곳을 다니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한다. 그러고 보니 꽤나 먼 길을 걸어온 느낌이다. 발걸음은 긴장감과 무거운 생각들을 털어 내기라도 하듯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가끔은 이런 산길도 걸어 볼을 만 곳이 아닐까 한다. 채워도 채워진 줄 모르던 내 속에 있던 욕심과 이기가 어느 정도 쇼크를 받은걸 보면.
프로필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