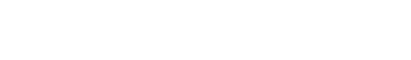꽃
윤남석
처마 밑, 우묵한 확에 열사흘 달이 들어앉아 꽃망울을 연다. 물먹은 달꽃이 토실토실하다.
늘 세상을 품고 싶어 하는 돌구유는 비가 내리면, 확에 빗물을 적당히 채운다. 확에 고인 빗물이 하늘을 빨아들인다. 새털구름 한 장을 고명처럼 담가놓기도 하고, 바람 한 자락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다. 돌구유를 감싼 떨기나무도 넌짓넌짓, 거울을 훔쳐보며 자태를 뽐낸다. 언뜻 박새도 스치고 팔랑거리는 흰나비도 활짝 편 날개를 비춰보며 자기색정自己色情에 젖는다. 빗물 담은 돌구유는 그렇게 세상을 안온하게 담을 줄 안다.
지금은 처마 밑에서 자연을 확 속에 담고 살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땅속에서 감나무 뿌리 등살에 시달리던 처지였다. 구유는 옆집 쇠마구간 자리에 있었다. 허문 아래채는 마늘과 배추 등을 심는 텃밭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고 구유는 텃밭 중간쯤에 묻혀 있었다. 옆집 할머니가 밭골 쓸 때마다 괭잇날이 구유에 부딪쳐 영 거치적댄다, 하기에 파내기로 작정하였다. 곡괭이 들고 조심해서 파내려가니 돌구유가 모습 드러낸다. 탱자 울 옆엔 뾰주리 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깊숙이 뻗은 뿌리가 돌구유를 칭칭 감고 있었다. 뿌리를 걷어내고, 지렛대 이용하여 구유를 끌어냈다. 구유가 생각보다 컸고 옮기려 해도 그 무게가 만만찮다.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굴림대질 끝에 간신히 우리 집까지 옮길 수 있었다.
투박스럽기만 한 돌구유를 물로 깨끗이 씻겨놓으니, 은연한 기품이 살아난다. 이 구유도 석수가 돌을 다듬기 전에는 한낱 툽툽한 돌이었다. 돌도 생김새에 의해 쓰임새가 정해진다. 석수는 두루뭉술한 모양새와 크기가 구유로 적합할 것이라 결정하고, 우묵하게 파내고 골랐을 게다. 속을 널찍하고 우멍하게 파낼수록 쇠여물이 푸짐히 담길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게다. 또 파낸 바닥을 편평하게 고를수록 여물 먹기가 수월할 것, 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만질만질하게 다듬었을 게다. 겉모양은 비록 볼품없지만 오로지 여물통으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게다. 그렇게 정성 들인 구유에서 소가 풍족하게 여물을 먹고 살 찌기를 바랐을 게다.
쇠죽간에서 쇠죽을 쑤면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작두로 썬 짚에 등겨와 콩깍지 등을 넣어 한소끔 끓으면, 솥뚜껑 열어 ‘ㄱ’자 모양 쇠죽 갈퀴로 골고루 뒤집어준다. 가마부엌은 물씬물씬 솟아오르는 김과 함께 쇠죽 냄새가 짙게 서린다. 큰 눈망울을 껌뻑이는 소는 구수한 쇠죽냄새에 입맛 다신다. 가마솥전이 눈물을 소란스럽게 쏟아내고. 뚜껑 열자마자 희뿌연 장막이 쇠죽간을 둘러친다. 가맛바가지로 구유에 퍼 담으면 소는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쇠죽을 어거적어거적,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다. 긴 혀를 날름거리며 쇠죽 먹는 소를 보면 더없이 마음이 푸근했다.
그렇게 쇠죽 냄새에 절어 있던 구유는, 오랫동안 흙속에 파묻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소가 내뿜는 허연 콧김이 맴돌던 구유에 매지근한 땅 숨만 짙게 퍼진다. 이따금 흙속 벌레와 나무뿌리가 간지럼을 놓는다.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바깥 기운을 어렴풋이 가늠케 할 때면, 답답한 땅속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게다.
그 돌구유가 세상의 빛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오랜만에 본 환한 빛살이 그리 눈부실 수가 없다. 확에 고인 물은
【창窓】으로
변모한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돌구유는 빛 머금은 창을 다채로운 무늬로 장식한다. 더없이 소중한 세상을 따독따독, 끌어안는다. 하늘은 늘 편한 낯으로 웅덩이에 착륙한다.
돌구유는 창을 통해 세상과 교신한다. 창은 확과 외부공간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탄생했듯, 플라톤학파는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출구가 프레세페Praesepe라고 했다. 프레세페는 ‘구유’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창은 바로 세상을 향해 활짝 연 출구다. 자유로운 드나듦이 이어지는 통로다. 돌구유는 확에 물이 마르지 않게 제 스스로 빗물 받아 채운다. 창, 을 통해 접신을 시도한다. 우주를 불러들인다. 태양도 끌어들이고 별과 달도 곱게 꽂아둔다.
오늘밤엔 달꽃이 우아하게 노닌다. 우주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 그렇게 여미한 각화刻花를 끝마쳤다. 별하늘로 답신하듯 풀벌레 [씨ㆍ르ㆍ륵ㆍ씨ㆍ르ㆍ륵], 진동음을 낸다. 밤은 이슥히 깊어가고, 생기 북돋으려는 달꽃이 조심스레 물을 빤다.
[작가소개]
수필가
작품집: 『찢어진 청바지 틈』